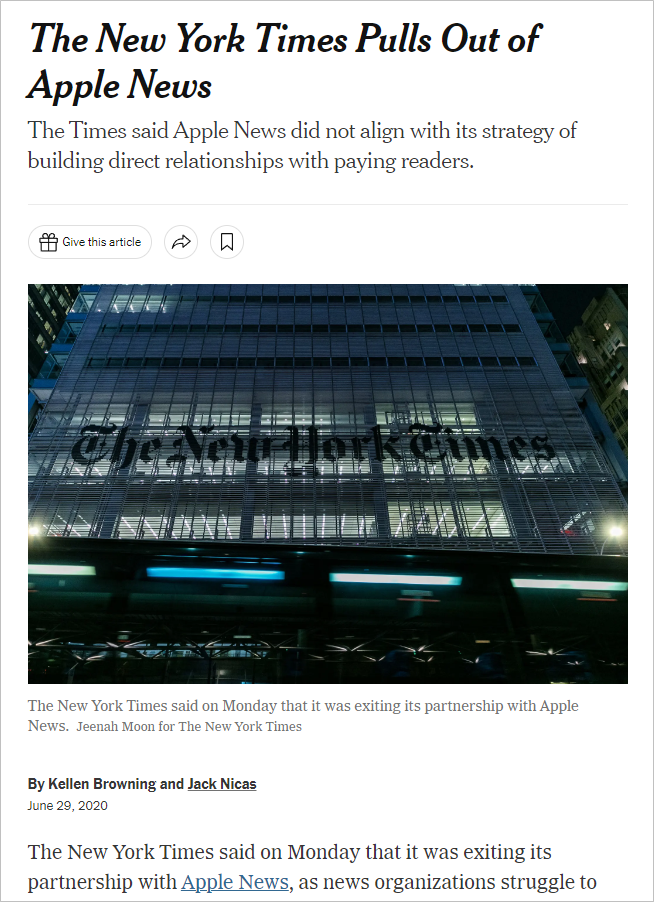‘삼성뉴스’ 앱 출시를 보다 이어진 생각
미국서 리뉴얼 버전 선봬, 유력 언론들 파트너로 ‘입점’
디지털 유료화 강화 불구 ‘이중노선’ 선택하기도…한국 미디어 시장 풍경과 유사
선례 학습 중요, 플랫폼 활용시 전략적 유연성 발휘해야
신이 다루는 미디어업계 뉴스에서 ‘한국 언론’의 존재감은 좀처럼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계가 자기 이야기를 바깥으로 공유하지 않는 풍토인데다, 서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고, 산업의 역동성은 떨어지며, 개별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또한 더디기에 주목도가 낮다. 새로운 것(news)으로 전할 만한 아이템 자체가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등장하는 미디어 서비스 뉴스가 필자 눈에 띄었다. 삼성이 미국에서 ‘삼성뉴스(Samsung News)’ 앱을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사가 아닌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 소식이긴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뉴스’를 키워드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기에 호기심이 생겼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역시 한국 기업의 ‘미국 뉴스’이긴 하다)
삼성은 미국(U.S.) 뉴스룸 4월 18일자 공지에서 ‘삼성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기본 탑재되는 앱이다. 다양한 언론사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일 브리핑과 맞춤형 피드, 팟캐스트를 통한 사용자 편의를 내세운다. 애플이 자사 디바이스(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에만 탑재하는 ‘애플뉴스(Apple News)’ 앱의 삼성 버전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실 ‘출시’라고 홍보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삼성프리(Samsung Free)’라는 이름으로 뉴스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비즈니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번에 삼성뉴스로 리뉴얼하며 새단장을 하고 명칭대로 뉴스에 초점을 맞췄다. 블룸버그 미디어, CNN, 포춘, 폭스뉴스, GQ, 허프포스트, 뉴스위크, 폴리티코, 로이터, USA투데이 등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진 여러 유력 미디어가 삼성뉴스 파트너다. 삼성이 개별 언론사와 직접 제휴 계약을 맺는 형태는 아니고 뉴스앱 업데이(Upday)를 통해 뉴스를 공급받는다.
국내에선 다소 낯선 업데이 앱을 살펴봤다.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와 삼성이 2015년 합작해 만든 스타트업이었다. 현재는 34개국에서 2500만명 넘는 월간사용자를 보유하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앱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막강한 뉴스 플랫폼이지만 업데이는 ‘입점’ 매체에 별도 뉴스값을 지불하거나 플랫폼 광고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대신 뉴스 노출도에 따라 개별 언론사 사이트 트래픽이 올라간다. 많은 유력 언론이 뉴스 영향력 확대, 잠재고객 접점 확보, 트래픽 증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업데이에 참여해 삼성뉴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삼성뉴스 출시 보도자료에도 녹아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속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허프포스트) “삼성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속보 및 영향력 있는 저널리즘 도달 범위 확장”(USA투데이 소유한 가넷)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 중 하나는 독자들이 있는 곳에서 독자들을 만나는 것”(포춘) 등 여러 언론사가 호평 일색인 것도 이채롭다.
더 흥미로운 건 포춘이나 USA투데이는 몇 년 새 온라인 유료화에 힘 쏟고 있는 매체라는 점이다. 두 매체는 무료뉴스-독자유입-광고수익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언론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콘텐츠 중심으로 디지털 유료화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국 내 다른 대형 일간지들에 비하면 유료 전환 시기는 늦은 편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체질 개선에 나서며 디지털 부문에서 광폭 행보를 다지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서 자사 채널을 넘어 삼성뉴스와 업데이 등 다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오디언스(audience)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유료와 무료의 이중적인 행보는 한국 시장의 풍경과도 닿아 있다. 바로 다름 아닌 포털뉴스다.
네이버‧다음을 주축으로 한 포털뉴스는 언론 시장이 훨씬 발달한 서구권보다 십수년 앞서 형성된 온라인 뉴스 생태계다. 요즘 글로벌 언론계를 달구고 있는 빅테크 뉴스사용료 이슈도 한국식(전재료)으로 훨씬 빨리 경험했다. 그만큼 포털뉴스는 한국 미디어 시장의 특수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내포한다. 포털 없인 언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면서도 포털 때문에 언론 자생력도 기르기 힘든 딜레마적 상황이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해외처럼 디지털 유료화로 전환하기 힘든 근본 원인이 포털을 통해 풀리는 ‘공짜뉴스’ 때문이라는 언론계의 볼멘소리도 늘 뒤따른다. 이제는 네이버 아웃링크 도입 여부를 놓고 또 첨예하게 갈등 중이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포털 빙벽 오르는 세계 언론의 공세
사실 디지털 시대 빅테크 플랫폼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 해외 언론이나 국내 언론이나 매한가지다. 차이라면 선례에 대한 학습이다. 한국 언론이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포털 탓을 하면서 내내 포털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과 달리, 해외 언론 중에선 빅테크 플랫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선례를 남긴 곳이 이미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그렇다.
NYT는 5년여간 저널리즘 확산 채널로 이용한 애플뉴스에서 2020년 ‘탈퇴’를 선언했다. 유료 독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자사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활성사용자수 1억2500만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 플랫폼과 쿨하게(?) 이별한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엔 애플뉴스로 인한 모객효과도 시원찮은데 플랫폼 안에서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는 불만도 깔려 있었다.
막강한 뉴스 공급처를 포기했음에도 NYT 유료 구독자수는 계속 늘어났다. 2020년 당시 디지털 전용 구독자 700만을 넘겼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려 2022년 말 기준으론 그 수가 880만으로 증가했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애플뉴스를 거치며 쌓은 5년간의 학습 내용 역시 디지털 전략 재설계의 재료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NYT가 무조건 자기 플랫폼만 고수하진 않는다. 일례로 NYT는 지난해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생 뉴스앱 아티팩트(Artifact)에 참여 언론사로 이름을 올렸다. 자사 디지털 전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외부 플랫폼과의 협업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큐레이션 뉴스 플랫폼 등장에서 주목할 점
저널리즘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주자의 혁신 우수성을 새삼 거론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독자가 저널리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취사선택하는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온라인 유료화가 대세라고 해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무료뉴스 강화로 노선을 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결국 디지털 생태계에서 자기 주도권을 갖고 여러 수단과 채널을 활용하기까지 겪은 시행착오와 계속되는 학습노력이 중요하다. 일련의 고된 과정이 한국 언론 어느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 이 글은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 4월 29일자 오피니언란에 [디지털 혁신 점검] 칼럼으로 게재됐습니다.